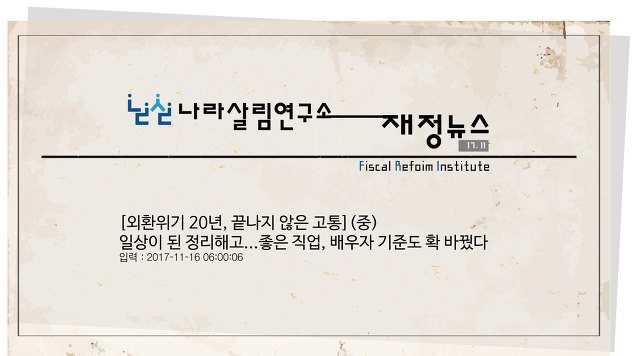ㆍ비정규직 양산에 개인 소득도 양극화
일상이 된 정리해고…좋은 직업·배우자 기준도 확 바꿨다](http://img.khan.co.kr/news/2017/11/16/l_2017111601002010200164711.jpg)
“여러분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못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2015년 12월 당시 장하성 고려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는 ‘상실의 시대’란 주제의 강연에서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의 언급은 강연 직후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크게 회자됐다. 한국 사회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지옥’에 빗대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던 청년들의 감성을 크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어쩌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부모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 그간 발표된 정부의 통계분석과 학계의 말을 종합하면, 고통의 시작은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으나, 그 질서에는 ‘비정규직 양산’과 ‘개인 소득의 양극화’라는 또 다른 병폐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 서민들의 고통, ‘저소득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대 가구의 소득은 3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원(3.7%)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한창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젊은 세대의 소득이 쪼그라든 것은 근로소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0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세대로 인식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일상이 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40대들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흘러들어 청년들과 함께 한 축을 이뤘다. 4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4년 128만명에서 2009년 14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악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었다. 2004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61만9000원가량이었으나, 올해는 128만원으로 약 두 배 늘어났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대기업들은 외환위기를 넘긴 뒤로는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웃소싱 등을 활용하며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정규직들과 외부 비정규직의 격차는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를 거듭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의 비율은 2006년 42%에서 2009년 52%로 상승했다. 2008~2009년 사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아예 줄어들었다. 이는 비정규직이 ‘노동유연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란 명목으로 도입됐으나, 그 뒤로는 단지 이윤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등 배우자감도 바꾼 외환위기
“외환위기는 1등 신랑감도 바꿔놓았죠. 이전까지는 대기업 직원이 최고 신랑감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로는 공무원·공사 직원이 이상적 배우자로 여겨졌으니까요.” 결혼정보업체 ㄱ사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같이 표현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좋은 직업’의 기준은 크게 바뀌었다. 통계청의 1995년 조사에서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안정성’(29.6%)과 장래성(29.2%), 수입(27.1%)이 균형을 이뤘지만, 1998년에는 안정성이 41.5%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공무원이 1등 신랑감으로 올라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불안의 한 단면이다. 해고가 일상화되고 저소득 비정규직이 양산되자 안정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갑질’에 당하는가 하면, 결혼조차 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남성 정규직의 결혼확률이 비정규직의 4.6배로 나타났다.
안정을 희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공공부문 임용에서의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 1980~1990년 입시학원이 몰려 있던 서울 노량진 학원가는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 학원이 대세를 이뤘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등락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4월 4910명을 뽑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에 22만8000명이 지원해 46.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나태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일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혁신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공부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관치보다는 시장에 맞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부각됐다”며 “그 뒤 공공부문의 경쟁 확대 필요성과 민간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대립되는 프레임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 새 정부의 처방,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연설에서 외환위기 당시를 회상하며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외환위기가 남긴 한국 경제의 숙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란 지적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처방들도 외환위기가 남긴 한국 사회의 특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 재정을 풀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확충해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구상했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가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외환위기 등이 남긴 트라우마가 한국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질 좋은 일자리의 시작이 되는 공공부문의 채용 증대도 재정부담과 국가경쟁력 저하의 우려에 막혀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입사에 대한 대중의 선망이 매우 커져 있다 보니 ‘과다한 보상’이나 ‘역차별’로 인식돼 반발이 크다. 전병유 교수는 “외환위기로부터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정부들이 대·중소기업 문제나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으나, 격차가 워낙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며 “시장에 개입하기 쉽지 않고, 공공부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도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