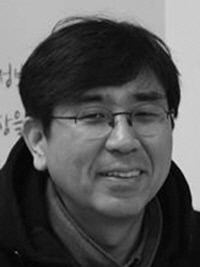민영화의 그림자가 공공기록관리의 영역에 드리우기 시작했다. 2014년 12월 공공기관의 종이기록을 폐기하고 전자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더니, 올 3월 보존기간 10년 이하인 기록에 이를 수용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급기야 지난 7월5일, 일부 공공기관의 전자기록 보존업무를 위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오는 9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는 이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850여개 ‘기타 공공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해서라고 한다. 알쏭달쏭하다. 저간의 사정을 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부터 요청받은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를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7월10일자 정부 보도자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기록물 보존을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전자문서법상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이 불가해 기록물 보관 관련 신규 투자 수요”를 저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기록원장 지정·고시)을 활용해 전자기록물을 보존·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이다. 신규 투자수요라는 기업과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공공성의 논리로 시작된 일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적용대상인 기타공공기관들이 전자기록관리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전자기록관리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찾은 해법이 민간기록물 관리시설의 허용이라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다른 대안과 처방에 대해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일이다. 일방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민간영역의 공공기록관리를 고민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일이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저력과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는 그 정책에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는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의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의견을 내고 있다.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에서부터 공공기록관리 주권의 포기라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보안의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든, 민영화든, 그 근저에는 공공의 영역보다 민간의 영역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뛰어나다는 전제가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가져올 제도의 변화가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록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일부 양보할 만큼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아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 위탁과 민영화 사례들의 끝자락에 공공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민간기업에 공공기록관리 문제의 해법은 없다. 공공기록관리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김유승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 칼럼은 2015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